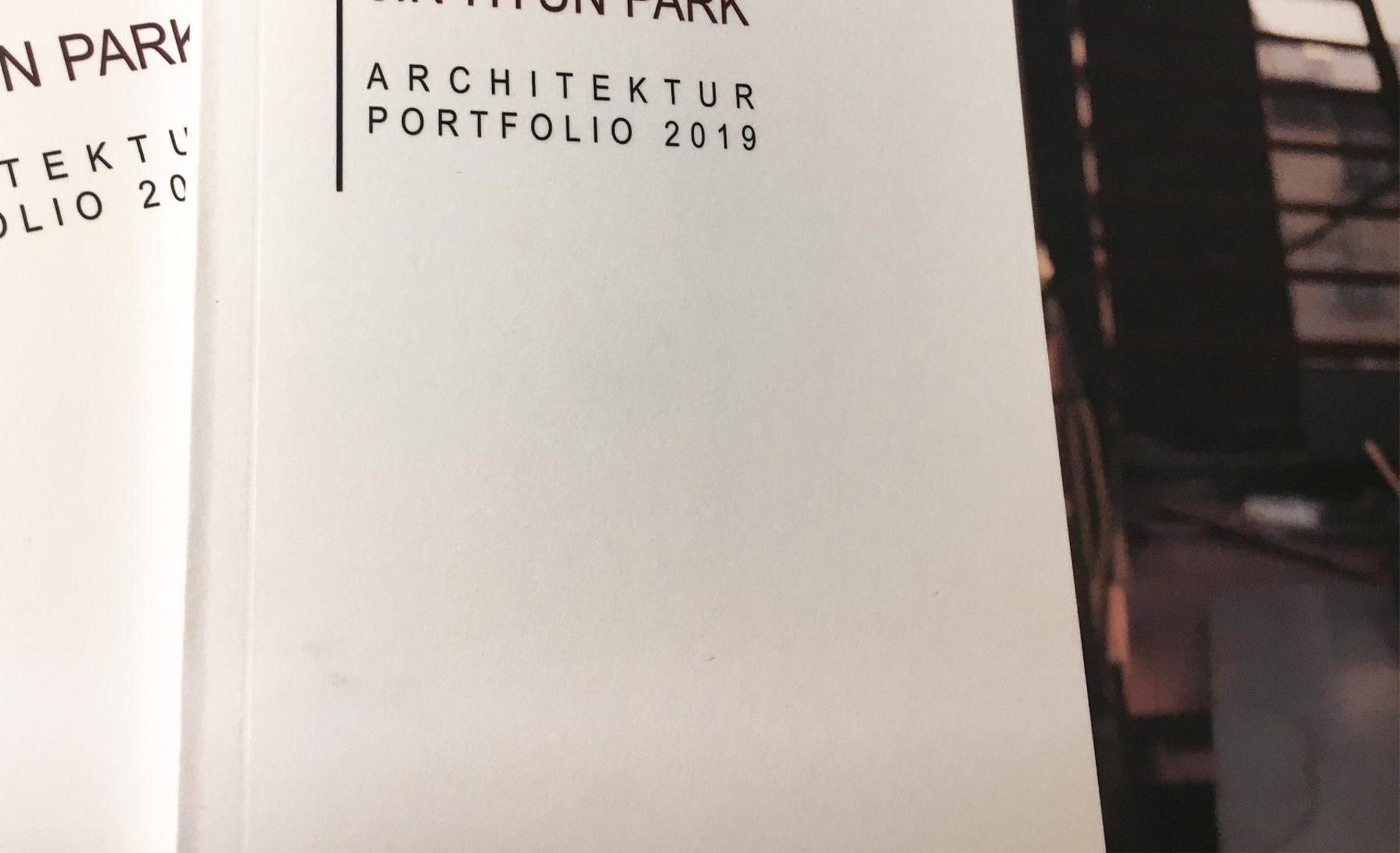
그저께 처음으로 본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 실패한 걸 적어놔야겠다.
실패를 기록한다는 것은 어려운일인 것일 수도 있다.
큰소리 떵떵 치면서 자신 있게 외국으로 나왔는데 더군다나 실패를 했다는 것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건,
나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실패를 기록해서 나는 이런 기록을 통해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삶을 남기고 싶었다.
원래는 단번에 성공하면 성공을 좋아라 하면서 쓰겠지만, 그게 아녔으니 실패에게도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썼다.
사실 말이 실패지 결국 이런 것도 다 경험이다.
이런 실패를 30대 초반에 해봐야지 40대 되면 무서워서 시도도 못한다. (자기 합리화 중)
실패라는 게 별건가, 어제까지 졸라 침울해하고 있었음. 센 척 중
그리고 뭐 내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이 내 실패를 보고 안도했으면 좋겠다.
여기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첫 번째 실패 아닌 실패는 한국에서 건축으로 적응하기.
실패아닌 실패라고 적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응을 한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이렇게 뛰쳐나온 거 보면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대략 3년 정도의 설계사무소 경험이 있다.
한국에서 좋아라 하는 형식상의 경험은 2년 6개월이지만, 인턴에도 나는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무튼 3년이다.
그중 첫회사에선 약 7개월 정도를 경험하고 나머지 사무소에선 2년 3개월 정도를 경험했다.
한국에서 학부로는 건축의 배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대학원까지 진학했고 결과는 만족했다.
좋은 지도교수님을 만나고(지도교수님도 한번 바꿈) 양질의 수업을 들었다.
건축이론과 건축 철학이 바로 그것.
무튼 지도교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했던 교수님의 소개로 하나의 건축사무소에 들어가는데,
정말 쓰레기였다.
사실 첫 번째 지도교수님도 심했다. 말로 모욕감을 줬고, 열정 페이가 대단했으며 시급 한 천 원? 그리고 좁은 사무소에서 일을 같이할 때 매너가 없었다 (방귀 뀌기, 트림하기,)
가장 심하게 들은 말은 "넌 왜 그렇게 생겼어? 넌 감정이 없어? 왜 이렇게 안 웃냐?"
지금은 다른 과가 언론에 인격모독으로 많이 발각돼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들었지만,
설계 수업에서 내 인격은 종종 사라졌다. 노력은 안 한 것도 아니었다. 점수도 그럭저럭 받았고 잘 받았을 때도 있었다.
대부분의 수업들은 뭐 별 탈 없었지만 그 몇 번의 말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무튼 그런 것들을 거쳐도 건축이 좋았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던 나발을 하던 내 마음에 들고 완성도 있는 작업을 했으면 그때의 뿌듯함은 말할 수가 없다.
거기에 외부 교수님의 칭찬이나, 담당교수님의 칭찬이 있을 때면 그때의 성취감으로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론도 재밌고, 좋았다.
그래서 큰 회사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 선배들이 가면 맨날 피피티만 만들거나 현상만 할 거라고 겁을 줬고 분업화 되어있는데서 내가 하나만 하기에는 싫었다.
그래서 작은 회사를 가기로 마음먹었고 교수님의 소개로 들어가게 되었다.
프로젝트도 괜찮았다.
하지만 소장님이 안 괜찮았다.
일단 연봉 나누기 13. 처음 회사니까. 넘어갔다.
휴가는 5일. 주말 붙여 쓰면 열흘 가능하다고 개소리했음. 처음 회사니까 그러려니 했다.
야근은 기본, 하지만 야근비는 없음. 처음 회사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
혼자 자취하니 빠듯하게 살기 시작했다.
소장은 닛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아들은 골프를 시켰고 아들 차도 법인차로 뽑았다.
게다가 소장은 내 디자인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고함을 질렀다.
내가 소장의 디자인이나 주택이 진짜 잘한 거나 세련되었거나 뭐 그러면 말을 안 한다.
촌스러웠다. 그러면서 나보고 매일 지랄을 했다. 솔직히 지나 나나,
심지어 대리가 내 디자인을 까서 바깠는데, 대리 말대로 한 디자인을 까고 또 지랄을 하면서
내가 원래 했던 디자인으로 자기가 그리는 것을 보면서, 뭐야 너나 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면도 못 짠다면서 지랄했다. 구조도 모른다면서 지랄을 했다. 나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다.
지랄을 할 땐 항상 고함을 쳤다.
내가 집에 가서 혹은 화장실에서 울기 시작했다. 하 진짜 이때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 네시까지 회식을 했고, 건축주 미팅이 다른 날 있으면 그때도 회식을 했다.
회식을 하면서 집에 간다고 하기가 무서워서 술집 밖에 주차장 기둥에 기대서 졸다가 들어갔다.
술도 매일 강요했다.
이렇게 씨발 같은 나날들을 6개월 지내고 나니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미련하지도 인내심이 많지도 않아서 결국 회사를 다니며 몰래몰래 이력서를 썼다.
그렇게 두 번째 회사에 합격을 했다.
그만둔다고 하는 게 무서워서 엄마를 팔았다. 엄마가 아프다고 집에 내려가야 한다고 뻥을 쳤다.
거짓말이 들킬까 무서워 울면서 연기했다.
절박했던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 갔다.
소장님은 쿨했고 젊었고 꼰대가 아니었다.
디자인도 내 제안을 웬만하면 수용해주셨고 재료 선택에서 내 논리와 근거만 명확하면 내뜻대로 했다.
현장에도 나가서 직접 체크하고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직접 했다. 재밌었다.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지나고 나면 다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었다.
사내 분위기 또한 수직적이지 않았고 노동법이나 정부 현안에 대해 침을 튀기며 비판하는 소장님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다.
퇴직금도 있었고, 급여는 적었지만 법정휴가도 있었다.
내가 스케줄에만 맞추고 해야 할 일들을 그때까지 끝낸다면 야근도 없었고 눈치도 주지 않으셨다.
리프레쉬 휴가라고 5년 일하면 무급으로 한 달 쉴 수 있는 제도도 있었다.
회식도 많이 하지 않았다.
회식은 항상 이탈리아 레스토랑 집에서 했고 술도 권하지 않으셨다.
괜찮은 회사였다. 급여가 적었지만 상관없었고 일이 즐거웠고 재밌었다.
하지만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과 기타 등등의 4대 보험료를 안 내시고 있었다.
노동에 대해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고 한국이 어떤 사회로 나가야 하는지 매일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그와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재정이 엉망이었다.
첫 달 급여를 잘 받고 그다음 달부터 밀리기 시작했다.
3일, 4일, 5일, 어쩔 땐 열흘도 밀렸다.
아 안 되겠구나 싶었다.
예전에 일했던 동료의 말을 들어보니 지금은 2개월 밀려있다고 했다.
그만둘 때 침몰하는 배에선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하면서 약올리면서 그만뒀는데 정말 내가 승리자였음
건축 프로젝트들은 정말 재미있었는데, 항상 상황이 그지 같았다. 첫 번째 건축사무소도 프로젝트와 건축주들은 좋았다.
작업환경이 왜 이럴까,
왜 제대로 된 회사가 나에겐 없을까.
야근 없이 일하다 보니 야근 있는 회사로 옮기는 게 싫었다.
그래서 고민을 했다.
사실 독일도 마찬가지로 건축이 박봉이다. 거기에 세금이 엄청 많다.
그래도 독일로 온건 사람답게 일하고 싶어서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급여 제때제때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허가기간이 최소 3개월이라는 점.
사실 이게 컸다. 한국은 허가가 한 달이면 나는데 소장님은 3주에서 2주로 항상 앞당겨서 받길원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잦고, 건축주는 보채고, 소장님은 나를 보채고, 나는 공무원을 보채야 하고
그럼 공무원이 화가 나서 더 느리게 하거나 나에게 맨날 화를 낸다.
악순환의 고리였다.
그래 최소 3개월 6개월이고 길면 1년인데 그럼 최소한 나를 맨날 쪼으진 않겠지 싶었다.
그래서 사실 독일에 오게 되었다.
별거 바란 건 없었고 환상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노잼의 나라, 세금 40프로, 의료도 별로, 인종차별, 언어 개 어려움, 등등 맨날 부정적인 거 찾아봤다.
그래도 뭐 이 1년 실패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100세 인생에서 얼마나 그렇게 차지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며 왔다.
'디알.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독일에서 구직하기 : 드디어! (3) (6) | 2020.01.28 |
|---|---|
| 독일에서 구직하기 : 인터뷰 그리고 아직은 진행 중 (2) (2) | 2020.01.13 |
| [독일생활] Danke 병에 걸림. (1) | 2019.07.23 |
| [일기] 나는 더이상 '니하오'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 (0) | 2019.06.23 |
| [일기] 다짐 (0) | 2018.05.01 |